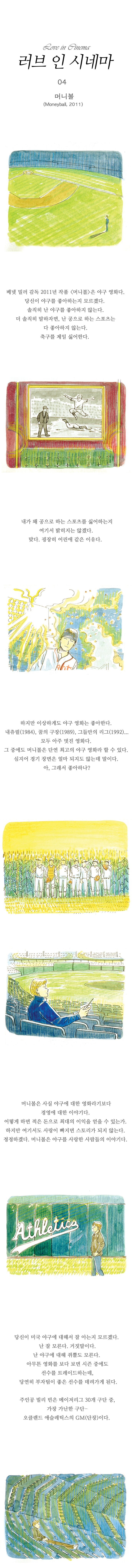<머니볼>엔딩의 브래드·피트의 얼굴 클로즈 업, 너무 인상적이다. 다시 한번 보면 눈길을 끈다. 아니, 카메라를 여기까지 접근하는 것을 생각하다니. (웃음)꼭 클로즈 업만이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엔딩 장면의 전체적인 카메라 워킹이 꽤 재미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린다/ 내려야 할 감독(or촬영 감독)들도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사실 엔딩의 감정과 메시지는 앞에서(영화의 1/3지점에서)한번 선 보였으나 꼴이지만, 엔딩에 이르고 더욱 깊어졌다.처음 봤을 때는 이름도 모르는 배우였다 죠나·힐의 연기가 눈에 들어온 것도 수확. 처음에는 “저 녀석은 누구냐”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었는데, 어느새 브래드, 피트와 함께 영화를 이끈다. 대화 장면에서(일반적인)어깨에 매는 샷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번의 감상이고 눈에 띄는 점. 거의 모든 미팅 장면에서 완고하게 느껴질 정도고 원샷을(혹은 os샷을 쓰지 않기를)고수하지만 그에 따라서 인물이 같은 시공간에서 대화한다는 느낌이 없다. 오로지 숫자와 계약으로 구성된 프로 야구 세계에서 인물들은 서로 감정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다.대화 장면에서 유일하게 숄 샷을 사용한 장면이 브래드, 피트가 딸과 함께 간 기타점의 장면. ” 남은 감정이 배제된 원 샷 장면과 대비되어 주인공의 감정이 똑똑 묻어 장면”(타격 연습장에서 대화 장면 같은 것도 꽤 흥미로운)이처럼 샷에서 인물의 감정 상태를 보이고 주는 영화 언어 재미 있다.

영화가 영화 언어를 말하듯 문학에도 당연히 문학적 언어와 기법이 있다. 이를 감지하기 시작할 때 훨씬 재미 있지만 대개 서사, 주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에 멈춰서는 게 유감이다.물론 영화인 문학이다 이렇게 감상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기 어렵다. 그리고 무수한 불빛 사이에 ” 느낀다”일이 있으므로 굳이 분석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한다. 하지만 1년에 1-2편 정도는 “여기까지 “디테일에 보라/ 읽고 싶은 영화와 책이 있다. 다 그런 거잖아. 우연히 무심코 좋아하게 되어 버린 작품이 된다. 우리는 특정 작품과의 만남을 그 우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작품은 상호 참조망 안에 있으니까. 특정 작품이 왜 좋은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기타 읽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도 재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다른 평범한 작품과 구별되는 ” 좋은 작품”의 정수는 디테일에 있고, 그것을 잡을 때 더욱 깊고 정확하게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신·현철 평론가들도 자신의 책 제목을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고 한다.